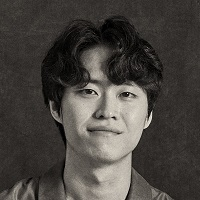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소송 쟁점 된 ‘비법인사단’
이날 재판부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 볼 수 없으며 ‘비(非)법인사단’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비법인사단은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춰 법적 지위를 갖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군포로 측은 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궤변의 판결”이라며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 번의 예외 없이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노씨 등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다”며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국내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북한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원씩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경문협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내려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번졌다.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유사 소송 혼란 불가피…“대법원 결정 나와야”
북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부족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한 헌법 3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법당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민사소송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우리 영토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反)국가단체로 일관되게 보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통일을 위해 교류·협력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수는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