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1977년 영일만 산림 복구 장면. 사진 문화재청
1961년 산림법 제정, 67년 산림청 발족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전국의 나무 식재 수준은 ㏊당 6㎥로 최악의 상태였다. 광복 전인 1942년 남한의 나무 총량(입목축적)은 6500만㎥이었지만 52년에는 3600만㎥로 줄었다. 피란민 땔감 소비는 늘었으나 전력·석탄 부족은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당시의 상황이 10년만 방치됐으면 전국은 민둥산이 되고 산림녹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황폐지 복구를 위해 1961년 산림법, 1962년 사방사업법, 1963년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산림 관련 법령을 차례로 만들었다. 이어 1967년 산림청을 발족해 산림자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산림녹화사업을 시작했다.

1973~1977년 포항 영일만 산림 복구 장면. 사진 문화재청
대통령 해마다 식목행사
이런 노력 덕분에 국내 나무는 반세기 만에 15배 증가했고, 황폐국·개발도상국에서 산림녹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2020년에는 ha당 165㎥로 증가해 푸른 숲이 조성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세계 평균(31%)의 2배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1960년대 산림녹화 포스터. 사진 산림청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혜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등 20건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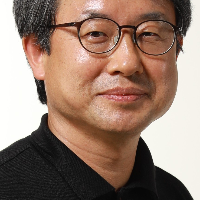




![[단독]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檢송치…BTS 지민 등에 23억 빌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b576e0b9-0d20-4047-abf5-558f7d6336e3.jpg.thumb.jpg/_dc_184x114x184_/)







![[단독] 이주호, 의대생들과 만난다…의정갈등 이후 첫 간담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3185bc49-0b8a-42cc-9539-df2ac42eba4c.jpg.thumb.jpg/_dc_184x114x184_/)




![[속보] 훈련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등 떨어져…”피해 없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45d24191-d875-4852-b98e-bcc6baef617f.jpg.thumb.jpg/_dc_184x114x184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