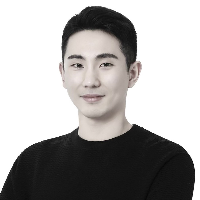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합헌4, 위헌5… 정족수 못 채워 '합헌' 결론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회사)의 재산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는 사용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실력행사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면서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파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이 낸 위헌 의견은 "단순 파업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파업에 형사처벌… "예측 불가·심각한 손실 초래 여부가 기준"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은 노조 간부들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노조 간부들은 2012년 2월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하지만 헌재는 10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은 헌재 출범 후 최장기 계류 사건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내놓은 적이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조건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의 파업, 파업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축소 규정했다. 사업장 점거나 기물 파손과 같이 폭력 행위가 없는 단순 파업도 거의 대부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