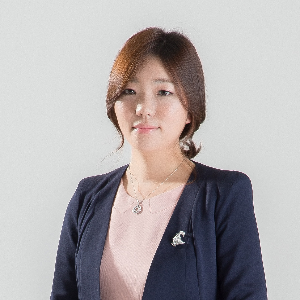2025년 2월 3일 미국발 관세로 무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계획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이와 함께 "미국산 제품은 미국 선박을 이용하자"는 취지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상으로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엔 5%, 7년 후엔 15%로 최소 기준 비율이 올라간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품은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 선박 업체들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과 그렇지 않은 선박을 별도의 운영 회사로 분리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없는 회사만 미국에 기항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잘못된 처사"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때도 "中조선·해운 불공정"
이번 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산업 관행을 조사한 뒤에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USTR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인 1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고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USTR은 "중국이 해양·물류·조선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캐서린 타이 당시 USTR 대표는 중국이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 안보 위험을 키우며, 미국 산업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18일 촬영한 드론 항공 사진. 선박이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다롄의 다롄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킹하는 모습. 신화=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조선 산업은 2000년 시장 점유율 5%에서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성장해 세계 1위가 됐다. 중국 정부가 주는 각종 특혜·보조금 덕분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3위다. 반면 한때 조선업계 선두주자였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USTR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올라가면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언론들은 "비용이 상승하는 만큼 추가 요금, 미국 서비스 축소에 따른 운임 인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조선업계에서 선박을 제때에 건조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2017년 이후로 신규 유조선이 건조되지 않았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5척 미만의 선박을 건조하는 반면, 중국은 1700척 이상을 건조한다.
이번 추진안은 내달 24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외신들은 "시행 여부 결정은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전했다.
"미 군함 건조, 이젠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최근 발의
미국 조선 산업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 발목을 잡았다. 1920년 상선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해서만 미국 내 해상 운송을 허가한다’고 규정한 '존스법'이 그 예다. 1965년과 1968년에는 ‘미군 선박과 주요 부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 제정됐다. 이 두 법 때문에 해외 업체와 경쟁을 피했지만, 조선업계 경쟁력을 잃었다.
이에 해당 법을 일부 수정해 미 해군 군함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해군준비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최근 발의됐다.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 제조 가능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정도다.
이에 해당 법을 일부 수정해 미 해군 군함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해군준비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최근 발의됐다.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 제조 가능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