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A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 대가로 이름난 한 흉부외과 교수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기로 했다. 경기도 B대학병원의 심장·폐 수술 전담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4명 중 3명이 최근 사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직했다. B병원 관계자는 “서울 대형병원이 인력의 블랙홀이 된 건 오래된 일이지만, 의정갈등 이후 더 심해졌다”라며 “우리는 지방 병원에서 모셔오려 한다” 했다.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A·B 대학병원 교수 사례처럼 지난해 정년이 아닌데도 사직한 의과대학 교수가 467명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을 포함한 전체 퇴직 의대 교수 3분의 2수준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 간 의과대학 퇴직 교원’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퇴직 교원 수는 2022년 563명, 2023년 577명이었으나 지난해 623명으로 늘었다.

신재민 기자
특히 정년을 채우지 않고 의원면직(사직)한 교수가 75%(467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인원은 2022년 299명, 2023년 379명 보다 늘어났다.

신재민 기자
지방 의대 사직자가 많았다. 경남의 인제대(72명)에서 가장 많은 교수가 떠났다. 64명이 사직서를 냈고, 정년 퇴임 등이 8명이었다. 뒤이어 한림대(41명), 을지대(38명), 연세대(34명), 서울대(23명), 순천향대(21명) 순이었다. 연세대, 서울대는 정년퇴직이 각각 17명,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퇴직 교원이 가장 많았던 인제대 관계자는 “교수들이 사직 시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그저 ‘좀 쉬겠다’고 한다. 주마다 2~3번 야근을 서면서 낮에 진료도 보는데 철인이 아닌 이상 버텨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각 의대가 대거 신규 교수 채용에 나서자, 지방 의대 교수들이 서울·수도권의 의대로 연쇄 이동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호남 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로 가겠다는 걸 말릴 방법이 없다. 채용 공고를 1년 내내 내도 교수를 모시기 어렵다”라고 털어놨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교수들이 개원을 하거나 처우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었다”며 “의대 증원으로 각 학교가 교수 정원을 늘리면서 연쇄 이직이 이뤄진 것도 사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료개혁이 오히려 지역 의료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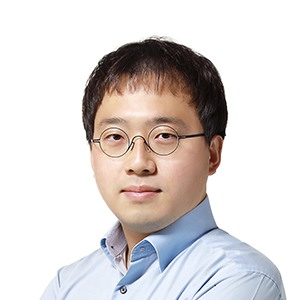








![[단독] 부정선거 ´일장기 투표지´ 진실…20세 알바의 ´적색 스탬프´였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3702ea65-bf39-499d-8c91-c3f1ef172f25.jpg.thumb.jpg/_dc_184x114x184_/)







![불굴의 의지로 중공업 초석 닦은 부도옹(不倒翁) [월간중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59c40e4a-c269-497e-803e-8afdbb728f85.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