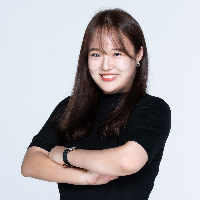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사진 공동취재단
미국 대법원 9명, 영국 12명…5개 전문법원 체제인 독일 350명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존 대법원은 중요 사건을 다루고 일반 상고사건을 처리할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헌법상 3심제를 훼손한다는 등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20년 당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4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지만 법원 내부 회의론에 동력을 얻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과 스페인은 각 전문법원이 있으니 대법관 수가 많지만 한국은 전문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급심을 전문화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수만 늘리겠단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상고심 청구 횟수 등을 연구하지 않은 채 나온 법안으로 보인다. 법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재판소원·법왜곡죄 신설에도…전문가 “악용 소지 크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제는 독일 헌재를 모델로 삼는데 독일은 헌법소원 중 90%가 재판소원”이라며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 사건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데 무턱대고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도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독일이 법왜곡죄를 활용해 나치 및 옛 동독 시절 사법부 과거사 청산에 활용한 게 모델이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4월 논문 『독일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과 적용』에서 “독일에선 나치 시절 사법 불법과 구(舊)동독 체제의 사법 불법 등 크게 두 국면에 걸쳐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활용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구동독 시절 사법 불법에 관해 2002~2017년까지 법왜곡죄로 73건의 재판이 이뤄졌고 실형 3건을 포함해 56건이 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창현 교수는 “국내 현행법으로도 판검사 처벌은 가능한데 나치 부역 판사를 처벌했던 독일의 법왜곡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왜곡죄 도입은 판검사 재량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권에 아부하는 판검사들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인데 거꾸로 판검사를 정권 입맛에 맞춰 아부하게 만들 우려가 다분하다”고 했다.

차준홍 기자
김문수, 이재명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
미국은 사법제도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사법방해로 규정한다.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도 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고의를 갖고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거짓 증언 외 허위자료 제출 등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방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처벌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대한 비판이 위축될 수 있고 정치적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개별 죄목이 있으므로 사법방해죄를 만들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형사소송법엔 사법방해죄가 별도 죄목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위증죄(형법 제152조) 등이 개별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