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에 앞서 설명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뉴스1
300㎿급 이하의 소형 원전인 SMR은 일반 원전보다 안전성·입지 등의 조건이 유연하고, 수소 생산·담수화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각국의 개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은 2030년께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다.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은 2035년 SMR 시장 규모를 최대 5000억 달러(약 650조원)로 예측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도 2050년까지 최대 140GW에 달하는 SMR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을 선점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전력원으로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일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14억원(7개 항목) 전액 삭감 등을 담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삭감 대상엔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 332억8000만원과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부터 진행된 SMR R&D 사업마저 '탈원전' 칼질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민관 합동 소형모듈원전(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발(發) 위기설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반박했다. 2029년 운영을 목표로 잡았던 뉴스케일의 사업 중단이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줄일 계기가 되고, 외부 투자 유치 등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종일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SMR은 아직 개발 초기인 만큼 다들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성이나 재원 마련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참고해 향후 국내 사업화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면서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모델 80여종 중에서 결국 시장에 남는 건 2~3종뿐이다. 앞서 나가던 뉴스케일이 주춤한 건 우리에게 악재가 아닌 호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 노형 개발과 병행되는 국내 기업의 기자재 수출도 타격을 받지 않았다. 국내 SMR 생태계가 탄탄한 데다, 뉴스케일이 미국 밖에서 진행 중인 루마니아 도이세슈티 사업 등은 정상 진행되고 있어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사업에 납품하려던 기자재는 데이터센터 사업 등으로 돌리는 걸 협의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 SMR 업체인 테라파워도 국내 기업에 연내 기자재 발주를 추진하는 등 한국의 'SMR 파운드리' 역할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삭감이 현실화하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거란 우려는 여전하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SMR 개발은 하루 한시가 아까운 상황인데 1년씩이나 뒤처진다고 하면 매우 큰 타격"이라면서 "국회가 SMR을 비롯해 삭감된 원전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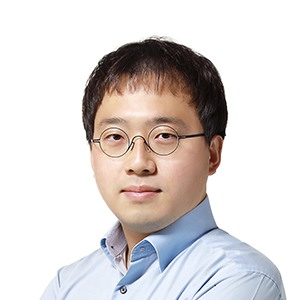
![尹 ”자승스님, 좌파나 간첩에 타살”…그날밤 군 소집했다 [尹의 106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9/b8fd1663-ef8b-4fe0-ae38-47954844411d.jpg.thumb.jpg/_dc_184x114x184_/)

![BJ 벗방에 돈풍선 쏘던 남편…용서 후 악몽 시작됐다 [이혼의 세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0/b2f2fcd2-980c-4997-88bf-4cc8e55e2ec6.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