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영옥 기자
계절은 완연한 봄날이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변의 가로수로 심어 놓은 꽃나무들로 온통 꽃 천지였다. 그중에 이팝나무가 단연 눈에 들어왔다. 과거 우리나라는 보리 이삭이 패는 바로 지금 이때가 보릿고개라고 불린 가장 먹고살기 힘든 시기였다.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시절 이팝나무의 흰 꽃들에게 쌀밥(이밥→이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저것이 밥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배를 곯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계절의 여왕 오월. 화창한 날씨를 보인 9일 대전 유성온천 문화의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흰 눈이 내린 것처럼 활짝 핀 이팝나무 꽃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이팝나무는 새하얀 꽃이 마치 흰 쌀밥(이밥)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용이 될 수 없다던 문재인 정부
앞서 서울로 이동할 때 버스 안 TV에서 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중시하겠다는 이번 정권에 어떻게든 흠을 내보겠다는 과욕에 오히려 큰 망신만 당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참 유치하다 싶었다. 한 후보자 앞에서도 특권의식을 여과없이 내비쳤던 민주당 사람들이 별로 가진 것 없는 평범한 국민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을지 절로 그려졌다. 그랬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미사여구 없어 신선한 취임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식전행사로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김성룡 기자
취임사도 마찬가지다. 식전 행사처럼 소박하고 간단했고 명료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조국의 번영과 발전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의 가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감동을 일으킬 구호가 없는 담백한 연설문은 오히려 신선한 자극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강한 조미료 같은 정치구호에 얼마나 식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취임사 서두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솔직히 이 말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했으면 혹시 와 닿았을까. 아니다. 국민이나 노동자 같은 집단 명사에서 벗어나 '나'라는 한 개인으로 대신했으면 어땠을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보다 내가 주인 되는 나라. 자유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둔다면 개인에 방점을 둬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인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사회다.
![[그림 이두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7/3654f1de-a926-4338-9f0f-024860518c60.jpg)
[그림 이두수]
법과 규제로 안전해지지 않아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양극화되는 것은 반지성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의한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지성은 좋은 대학 나오고 고위직에 오른다고 쌓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고는 현실 속에선 극심한 언행 불일치를 보이는 게 요즘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사회 리더들의 모습 아닌가.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닦는다는 뜻의 절차탁마(切磋琢磨·자르고 깨고 쪼고 가는 행위)라는 말은 노동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성인들이 즐겨 쓰는 적잖은 말이 노동현장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사회 리더는 물론이요 노동현장의 사람들까지 절차탁마하는 마음으로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이 있는 지성 사회가 될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굳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노동현장에서 붉은 깃발 휘날리며 외치는 ‘타도하자, 몰아내자’는 구호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봄날이다.
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노동 관련 단어 중에 삽질도 있다. '쓸데없는 짓 한다'는 비아냥 섞인 말이라는 걸 알지만 보통 사람은 물론이요 "노동이 신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쓸 말은 아닌 거 같다. 진짜 삽질 좀 해본 사람에겐, 삽질은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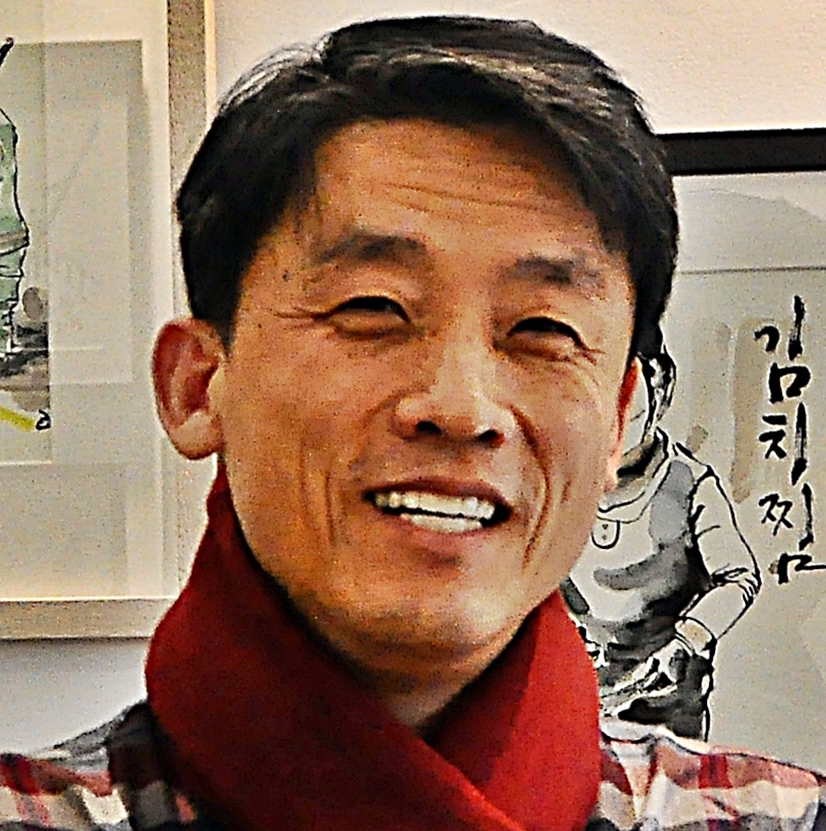











![소년공·인권변호·노동운동…´참혹한 삶´을 스승 삼은 이재명 [대선주자 탐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315f58d1-ac82-4ef9-91f2-dd57f87908e3.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