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지난 9일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간·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여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소년범죄가 ▶흉포화 ▶저연령화 ▶발생건수 증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촉법·우범 뒤섞여 통계가 없다…"정확한 규모·추이 아무도 몰라"

경찰 통계는 촉법소년(형벌 법령을 위반한 만 10세~만 14세 미만 소년)과 우범소년(집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음주 등 소란을 피워 형법을 저촉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 함께 잡히는 구조여서 정확하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촉법소년이 매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전체 규모와 추이를 확인할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아동)은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는 ▶촉법소년 규모의 과소평가(실제로는 더 많다) ▶저연령화 경향에 대한 잘못된 해석위험 (저연령화 아닐 수 있다) ▶소년범죄자 중 재범 비율 증가는 통계적 허상일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소년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 자료가 없다”며 촉법소년 기준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처벌이 능사 아냐… 선진국은 '교화' 중심"
실제로 미국 등은 1990년대 소년범에 엄벌을 내렸지만, 되레 재범률 증가 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고 교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복귀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펴낸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에 따르면, 미국은 살인, 무장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13~16세는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으나 처벌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았다는 통계가 나오자 다시 교정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00년 이후부터 처벌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시스템으로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2015년 한 연구에서 구금시설에서 출원한 청소년 67%가 1년 이내에 재범한다는 통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년범에 대한 교도소 수감 등 강력 처벌이 거꾸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동훈 "흉악범만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 열어둬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장관도 “실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악범죄만 형사처벌된다"며 여론을 설득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에서 제외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범죄는 기존처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청소년이 강력범죄 유혹을 뿌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예방 효과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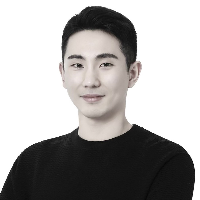








![[단독] 전야제 거부당한 김문수, 결국 5·18기념식 안 간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edce5bde-d3d4-47a5-93de-df8ca5dc5670.jpg.thumb.jpg/_dc_184x114x184_/)

![종이책 펼 때보다 사고력 더 깊어졌다, 아이패드 교실의 반격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7/63e21f1f-1857-4e56-98ee-48e2078178e3.jpg.thumb.jpg/_dc_184x114x184_/)



![78세까지 월급 618번…월급쟁이 소리 싫어 오너처럼 일했다 [더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9544078f-32c5-4fa8-a6e2-c4a4f5a2227d.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