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가 급등기에 한국 수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도 커지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 수출은 566억7000만달러, 수입은 661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뉴스1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역수지는 1년 전보다 454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중 수입 단가 상승 등 단가 요인에 따른 감소액은 472억 달러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는 867억 달러지만,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폭은 395억 달러에 그친 결과다. 원자재 가격 상승 폭보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의 가격 상승이 덜했다는 뜻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반면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 등 수출입 물량 요인으로 살펴본 무역수지는 1년 전보다 18억 달러 개선됐다. 올해 수출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165억 달러였고,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147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입 물량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폭이 -86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어지는 건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한국 수출 체력 자체가 약해진 영향도 있다. 특히 과거 국제유가 상승 때마다 무역수지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휴대전화·디스플레이·선박·자동차 수출이 둔화했다.
유가 상승기였던 2011~13년에도 에너지·광물 분야에서는 164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그런데 반도체(195억 달러)와 무선통신(199억 달러), 디스플레이(305억 달러), 자동차(613억 달러), 선박(403억 달러) 등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며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반면 올해 1~8월에는 사정이 다르다. 에너지·광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2052억 달러로 불어난 반면, 무선 통신(26억 달러)과 디스플레이(174억 달러), 선박(147억 달러) 등의 흑자가 이를 충분히 만회하지 못했다. 반도체만 같은 기간 629억 달러 흑자를 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반도체의) 수출 단가하락 및 물량 증가세 둔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IT 부문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 수출구조가 변화한 것도 무역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무역수지는 한국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만 집계된다.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수출하는 물량은 잡히지 않아, 해외생산이 늘면 통관기준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해외생산은 한국 기업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익을 측정하는 경상수지에는 온전히 반영된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만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더라도 중장기전망은 전망은 어둡다. 보고서는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복귀하더라도 해외생산 확대, 중간재 수입의존도 심화 등 국내 수출입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자급률 제고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View & Review] 해외생산 늘어 상품수지 흑자…‘경상수지 적자’ 피해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06/ba7b2462-c031-40fb-a31c-40b6b3582fce.jpg.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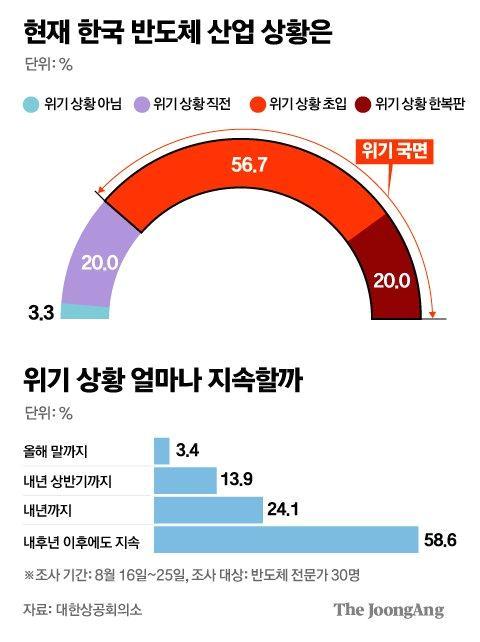








![“내다, 대통령이다” YS 전화…홍준표 공들인 노무현의 좌절 [대선주자 탐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55a04942-07b5-4259-a7fc-97536217278c.jpg.thumb.jpg/_dc_184x114x184_/)





![[단독]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40대, 중국행 출국장서 잡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50cbb88e-03f8-4aba-a309-0b1665cc6e9d.jpg.thumb.jpg/_dc_184x114x184_/)



![[팩플] 명령 없어도 ´셀프´ 개발하는 AI, 구글 ´알파이볼브´ 공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73778a18-47bb-4131-9c37-affb44e47426.jpg.thumb.jpg/_dc_184x114x184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