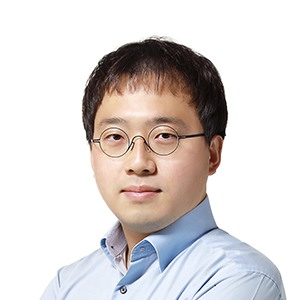연구에 참여한 분당서울대병원 김지현 교수, 서울대병원 안요한·정재호 교수(왼쪽부터). 사진 분당서울대병원
대개 신장과 눈은 완전히 다른 기관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뱃속 태아 시절엔 PAX2라는 특정 유전자에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한다. 극소수의 인구에선 이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고, 신장·안구가 제대로 형성되거나 발달하지 못 하는 희귀병을 앓게 된다. 이런 환자들은 소아·청소년기부터 만성 신부전(신장 기능 저하)과 눈 떨림·사시·시야 결손 등의 이상을 겪을 수 있다.
같은 PAX2 유전자 변이라도 일부는 10대 초반부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등 증세가 심한 반면, 어떤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신장·눈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등 환자별 편차가 크다. 하지만 지금까진 어떤 요인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서울대병원 안요한(소아청소년과)·정재호(안과) 교수 팀은 2006~2022년 국내 4개 기관에서 PAX2 유전자 변이로 확인된 환자 27명을 분석했다. 또한 기존 연구를 포함해 총 328명의 환자 데이터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만성적인 신장 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중앙포토
절단형 변이를 가진 환자들은 평균 11세에 신장 기능을 완전히 잃고,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했다. 반면 비절단형 변이 환자는 평균 24세까지 신장 기능을 유지했다. 또한 절단형 변이 환자일수록 눈의 이상이 흔하고 어린 나이부터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눈과 신장에 함께 문제가 생기는 '신장시신경유두결손 증후군'도 자주 나타나는 편이었다.
연구팀은 PAX2 유전자 변이 환자가 겪는 증상이 단백뇨(37%)와 안과 증상(26%) 순으로 많다는 점도 규명했다. 김지현 교수는 "어린 나이에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인되거나 눈 떨림 같은 이상소견이 보이면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이들 환자의 예후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치료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 교수는 "유전자의 단백질 구조가 절단된 고위험군을 선별하면 조기 진단·치료를 통해 신장과 안과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병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늦추면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Human Genetics'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