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블우주망원경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심(深) 우주로 올라가면, 지구 상공 559㎞에 떠 있는 허블우주망원경은 지난 30여년간 지켜왔던 인류 최고 우주망원경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그간 허블우주망원경이 이뤄낸 우주과학의 대역사는 잊힐 수 없다.
블랙홀 관측은 허블우주망원경의 대표적 업적이다. 1992년 허블우주망원경은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 M87의 중심부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M87에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가스 원반이 초속 750㎞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태양의 20억~30억 배에 이르는 큰 질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홀의 발견이었다. 6년 뒤에는 이곳에서 거대한 제트가 분출되는 것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허블우주망원경의 대표적 작품 '창조의 기둥' 독수리성운에 있는 가스와 티끌로 된 3개의 탑 모양. 수광년 정도의 높이다. [사진 NASA]](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3/b5f674ff-4c13-4cb9-b9fd-c98763f3cebe.jpg)
허블우주망원경의 대표적 작품 '창조의 기둥' 독수리성운에 있는 가스와 티끌로 된 3개의 탑 모양. 수광년 정도의 높이다. [사진 NASA]
‘허블 딥필드’(Hubble Deep Field)도 대표적 업적이다. 1995년 12월 허블우주망원경은 별도 은하도 없는 듯 보이는 북두칠성 부근의 검은 하늘을 촬영했다. 10일 동안 노출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놀라웠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는 70억 년 전의 밝은 은하부터 120억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점까지, 보름달 지름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하늘에서 적어도 2000개 이상의 은하가 나타났다. 이후 2003년 9월~2004년 1월까지 촬영해 얻은 ‘허블 울트라 딥 필드’ 이미지에는 약 130억 년 전 우주 탄생 후 얼마 되지 않은 뒤 태어난 약 1만 개에 이르는 은하들이 나타났다.
1990년 발사 당시 허블우주망원경의 설계수명은 15년이었다. 이후 우주왕복선을 통한 5차례의 대대적 개ㆍ보수를 통해 30년이 넘은 현재도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장이 잦아지는 등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11년 아틀란티스를 마지막으로 우주왕복선 운영을 중단했기에, 더이상은 수리도 불가능하다. NASA에 따르면 허블은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대기권으로 재진입, 운명을 마칠 것으로 추정된다.
![허블우주망원경이 찍은 '우주 장미' Arp 273으로 알려진 2개의 상호작용하는 은하들이 우주장미의 줄기와 꽃잎 모양을 하고 있다. 지구에서 3억5000만년 떨어져 있으며, 안도로메다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NASA]](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3/718629e4-2552-47e6-9541-27d06f8064a9.jpg)
허블우주망원경이 찍은 '우주 장미' Arp 273으로 알려진 2개의 상호작용하는 은하들이 우주장미의 줄기와 꽃잎 모양을 하고 있다. 지구에서 3억5000만년 떨어져 있으며, 안도로메다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NASA]
박병곤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사업단장은 “허블우주망원경은 대기가 거의 없는 지구 상공 559㎞의 궤도에 떠서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수만 시간을 노출하면 거의 100억 광년 밖의 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며“별의 생성과 소멸 과정 연구 등 지난 30년간 허블이 인류에 기여한 업적은 일일이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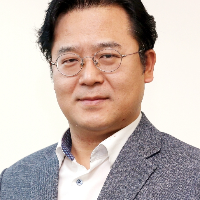




![[단독]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檢송치…BTS 지민 등에 23억 빌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b576e0b9-0d20-4047-abf5-558f7d6336e3.jpg.thumb.jpg/_dc_184x114x184_/)







![[단독]건진법사 부인 수상한 광산사업, 유력 정치인이 도운 정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7d8631b5-fb37-44ac-a45e-c6d6e9ac035c.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