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소각업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주민들이 업체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화면. 정종훈 기자
주민 A씨는 "6년 전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숨도 못 쉴 정도였다. 동네가 온통 새카맣고 머리가 아팠다"고 했다. 예전보다 연기나 냄새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각장은 주민의 골칫덩이다. 그는 "안 겪어보면 모른다. 소각장 없애려면 이번 선거는 OOO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충북 청주시에 선거용 현수막과 나란히 붙어있는 소각장 반대 플래카드. 정종훈 기자
소각시설 많은 청주, 주민 반발 거세
북이면·강내면 곳곳엔 6.1 지방선거 현수막과 함께 주민들이 내건 소각장 반대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마을회관엔 '소각장 설치 반대투쟁위원회'라고 써있었다. 주민 거부감이 크다 보니 청주시장 후보들은 TV 토론회에서 소각장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소각장 저지'를 내세운 시의원 후보도 적지 않다.

2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 정종훈 기자
혐오 부추기는 지자체장…지선 올라탄 '님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자체장이 혐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부산 기장군수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과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나주시장도 2017년 쓰레기 반입 반대를 외치러 광주광역시청 앞으로 향했다.
선거철엔 폐기물 님비(NIMBY)가 최고조에 달한다. 6.1 지방선거에 나선 많은 후보가 '폐기물 시설 폐기'를 내걸었다. 충북 괴산군수 후보들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놓고 "원점 재검토" "주민 요청 고려" 같은 설전을 벌였다. 경남 김해와 경기 부천은 소각장 증설·광역화, 전남 영광과 경북 포항 등에선 SRF 발전소가 주된 공격 대상이다. 일부는 인근 지자체 후보와 연대해 '폐기물 시설 저지'를 내걸기도 한다.
서울시 광역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동구에서는 구청장 후보 3명 모두 소각장 설치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구 의원 후보들은 소각장 후보지 반대 릴레이 챌린지에 뛰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장은 어딜 가든 반대한다. (추진) 로드맵은 있는데 부지 찾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호수공원에서 '나주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가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 SRF 발전소 두고 지역 간 갈등도
나주 측에선 이웃 광주발(發)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나온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만든 SRF 연료가 100% 투입되고 있어서다. 이번 선거에선 반대 단체 주도로 나주 시장, 도·시의원 후보 등이 '쓰레기 연료 반대'를 내세운 정책 협약에 동참했다.
반면 광주는 나주의 반발을 이해하지만 SRF 사업 계약이 2031년까지 맺어져있어 파기할 수 없다고 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허가를 내준 나주시가 발전소를 못 돌리게 막으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SRF 연료 생산 중단, 발전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소송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했다.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설치된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폐기물 업계 "화장실 없이 집 짓자는 셈"
나주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도 "지자체가 문제를 방치하다가 정치적으로만 이슈화하니 답답하다. 해법 제시 없는 무조건적 반대가 이어지면 법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모든 정보 공개, 주민 이익공유 고려해야"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기는 크레인 운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4년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니 몇십년 지나도 재활용 시설 하나 못 짓는 일이 반복된다. 갈등을 풀려면 모든 정보를 꾸준히 공개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소각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거나 기업 이익의 지역 환원, 체계적인 시설 모니터링 같은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안준영·이상윤 연구위원팀도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폐기물 시설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지역 상생에 맞춰야 한다. 시설 특징에 기반한 정보 제공, 의사결정 초기 주민 참여, 지역에 편익이 돌아올 방안을 각각 달성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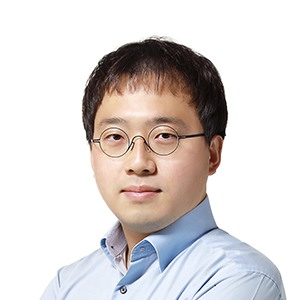















![[속보] 이재명 재판 또 대선 뒤로…法, 위증교사 2심도 ”추후 지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0e6ad05f-8d9d-4acd-b531-f28f6c3b1c0f.jpg.thumb.jpg/_dc_184x114x184_/)
![[단독] 기부 늘리는 삼성 오너家...이서현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5억 기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39929ec7-89cb-44e6-a746-b6926eaf1875.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