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 녹색연합
공동주택 등에서 투명(무색)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2020년 12월 시작돼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갈 길이 멀다.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인식이 여전히 낮고, 분리배출 후 별도 수거·처리 과정도 원활하지 않아서다.
'플라스틱 대국'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이다. 플라스틱 생산액은 55조원(2019년)에 달한다. 쓰고 버리는 양도 엄청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민 17.7%는 일주일에 7개 이상 투명페트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플라스틱은 2014년 220만t에서 2019년 402만t까지 늘었다.
페트병은 분리배출만 잘하면 되는될까. 녹색연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페트병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서울 강북재활용선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시설. 사진 녹색연합
분리배출 잘하면 끝? 선별·압축 미비도 걸림돌
투명페트는 유색 페트와 달리 옷, 가방, 신발 등을 만드는 고급 장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노끈·솜을 만드는 단섬유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치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단섬유 등 중저급 용도 재활용이 73%로 가장 많고, 고급(시트류 등) 15%, 기타 13% 순이다. 버려진 투명페트병이 모두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다. 2019년 기준 재활용률은 75%에 그쳤다.
고급 재생원료로 만들려면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는 순간 재활용 가치가 뚝 떨어져서다. 하지만 제대로 버렸더라도 재활용을 위한 선별업체로 가는 순간, 가치를 잃는 일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선별 업체 341곳 중 57곳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투명페트용 압축시설을 따로 사용하는 곳은 52곳으로 더 줄어든다.
별도 압축기가 없는 곳은 일반 플라스틱 압축기를 써야 한다. 그러면 투명페트에 기름이 묻거나 색이 들어가는 등 오염이 쉽게 발생해 재생원료 질이 떨어진다. 또한 식품 용기로 쓰려면 별도 선별·압축 시설이 필요한데, 모든 업체가 투명페트 전용 시설을 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쌓여 값싼 재생원료 위주로 재활용된다.

서울 강북재활용선별장에서 압축시설을 거쳐 부피가 줄어든 투명페트병들이 쌓여있다. 사진 녹색연합
옷 만들면 '재재활용' 불가…식품용기가 효율적
그래서 외국에선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활발히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한 페트병을 반복해서 재생원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음료용 페트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 비율을 2025년 25%, 2030년 3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 기준 미국은 페트 재생원료 생산량의 21%, 일본은 26%를 병 제조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플라스틱을 분쇄·세척해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곳엔 쓸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물병을 물병으로 재활용하는 길이 막힌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라면 식품 접촉면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현재 국내 페트 재생원료의 병 제조는 '0'이지만, 앞으로는 물병을 그대로 재활용한 물병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선별장에 일반 플라스틱과 뒤섞여 들어온 투명페트병. 사진 녹색연합
음료페트만 수거, 재사용 강화…향후 대안 될까
'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란 긴 과정을 거쳐 나오는 재생원료의 오염 여부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원료 안전성을 정기 점검하고, 식품용기에 쓸 수 있게 된 재생원료 기준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원료 용기를 쓰는 먹는샘물은 혹시 모를 건강 문제를 감안해 매년 2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식이다.
재활용보다 더 좋은 대안은 '재사용'이다. 재활용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유리 등 재사용 소재를 늘리는 게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깨끗한 음료페트만이라도 잘 분리 배출한 뒤 재활용하도록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량도 꾸준히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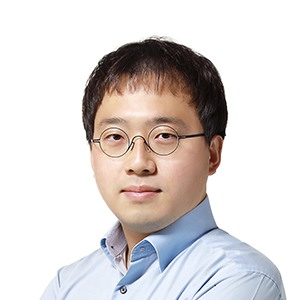










![[속보] 한화호텔, 매출 2조원 규모 급식업체 ´아워홈´ 품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10fe237a-4d4a-4760-9061-0f8f4e1638c1.jpg.thumb.jpg/_dc_184x114x184_/)






![[단독]1·2심 판사가 판결문 ´법령적용´ 누락 실수…황당 파기환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eb22b4b2-1f5b-4c61-b37a-076101278e3f.jpg.thumb.jpg/_dc_184x114x184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