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연구원 토카막 타일 교체 현장 르포

윤시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원장이 KSTAR 내부 토카막에 새로 설치한 텅스턴 디버터를 점검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름과 높이가 각각 10m, 무게 1000t에 달하는 KSTAR는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부직포로 만든 흰색 방진복을 덮어쓰고 높이 1m 남짓한 작업창을 통해 토카막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텅스텐 타일을 제작한 연구장비 생산 중소기업 비츠로넥스텍 기술진들이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사람들과 좁은 토카막 내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발 아래에 이미 설치한 텅스텐 타일 일부가 놓여 있었다. 길이가 채 1m가 안 되는 길쭉한 모양의 타일 하나의 무게는 150㎏에 달한다. 텅스텐은 비중이 19.25로 금속 중 가장 무겁고, 녹는점이 3422도에 달한다. 탄소 소재에 비해 녹는점이 높지는 않지만, 대신 밀도와 강도가 뛰어나고 열전도율도 높아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것도 쉽다. 이달 중순까지 들어설 텅스텐 타일은 총 64개. 모두 토카막 내벽 아래쪽에 설치된다. 다른 곳은 기존 탄소타일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국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KSTAR 외경. 김성태 프리랜서
KSTAR와 별도로 실증로 설계 착수
윤시우 부원장은 “1억도의 플라스마는 초전도자석을 이용해 토카막 내부에 뜬 상태로 있게 된다”며 “플라스마의 중심 온도는 1억도이지만, 위쪽 부분이 가장 덜 뜨겁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뜨겁다”며 텅스텐 타일을 쓰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텅스텐 타일 설치가 끝나면 11월부터 다시 플라스마의 불을 지펴서 올 연말까지 1억도 50초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2026년에는 300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억도 플라스마 300초 유지’는 핵융합발전의 선결 조건이다. 300초 동안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핵융합로를 24시간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핵융합발전을 위한 계획은 올 들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STAR와 별도로 지난 2월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6월엔 ‘실증로 설계 준비팀(TF) 착수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에 착수했다. 한국형핵융합연구로라는 명칭을 가진 KSTAR의 목표가 핵융합로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플라스마 1억도 이상 300초 유지)라면, 핵융합실증로는 플라스마를 이용한 핵융합 연쇄 반응을 통해 실제 전기 생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1단계 예비개념설계 완료, 2030년까지 2단계 개념설계 완료 및 설계 기준 확립, 2035년까지 3단계 공학설계 완료 및 인허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50년경부터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엔지니어들이 KSTAR 토카막 내부에서 타일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김성태 프리랜서
핵융합 관련 스타트업도 이미 활동
ITER 사무차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는 “한국의 핵융합발전 기술력은 초기 설계에선 미국이나 유럽 다음 가는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단계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해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핵융합 실증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앞당기려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핵융합 분야는 산업 측면에서도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KSTAR와 ITER 참여를 통해 확보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막(tokamak)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기장을 이용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는 도넛형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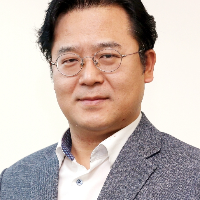












![흑백요리사가 차려준 ´술상´ 대박…요즘 술 브랜드 ´필승 공식´ [비크닉]](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d8513745-5d35-47d8-af43-b11ea6bc6b8f.jpg.thumb.jpg/_dc_184x114x184_/)


![3수 만에 실증나서는 ´수소열차´…3년 뒤 투입될 구간은 어디?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4ef1c31b-8851-4185-ab71-7957d110995b.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