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4일 헌법재판소가 선고 뒤 공개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엔 탄핵 인용 관련해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충의견도 입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요 심리 대상인 5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같았단 의미다. 헌재가 장고 끝에 내놓은 판단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 간 이견이 이제야 해소된 것”, “결론냈으나 국민통합 등 고려해 늦춘 것”등의 분석이 교차했다.
“탄핵 반대 여론 설득, 과열 분위기 진정 필요”
“갈수록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분석도 있다. 한상훈 교수는 “헌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고려했단 의견도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관들이 판단을 바꾸진 않았겠지만, 선고 시점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 이견 조율에 시간 걸려”

그래픽=김영옥 기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8인 전원일치였다면 늦어도 3월 중순에 결정됐을 거다”라며 “국회 군병력 투입 등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것 같다. 최종적으로 인용 의견이 다수가 되면서 인용에 반대했던 분들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무게를 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일부 재판관이 평의에서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요지엔 국회가 잘못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이런 부분을 넣는 것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갈등이 격화하다 보니 헌재가 최대한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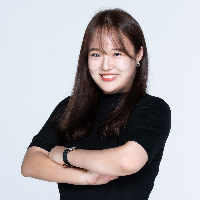







![[단독]”열사? 투사? 폭력 절대 안돼” 朴파면날 숨진 시위자 유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8d20a7f-5108-48cf-9891-71c637905d50.jpg.thumb.jpg/_dc_184x114x184_/)





![”집 좀 사세요” 금괴·별장까지 얹어주는 中 부동산업계[세계한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5/748f8269-b471-4470-bfe4-80c94f00f250.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