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7월 재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193개 회원국에 알렸다. 미국과 유네스코는 그간 분담금 납부를 포함, 이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재가입 시나리오를 놓고 장시간 물밑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8일 리처드 버마 미 국무부 관리·자원 담당 부장관이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네스코 재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6년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 AP=연합뉴스
미국과 유네스코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부터였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해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하자 유네스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한 미 국내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를 반(反)이스라엘 성향의 기구로 지목하며 2017년 10월 전격 탈퇴했다. 이스라엘도 미국과 동반 탈퇴를 감행해 외교가에 큰 파문이 일었다. 한때 분담금 1위였던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 입장에서 큰 충격이었다.
당시 양국은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비난하고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한 것을 탈퇴 구실로 삼았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자 중국은 곧바로 미국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유네스코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미국의 자금 공백을 메우며 영향력을 키웠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분담률은 약 19.7%로 1위다. 2위 일본(약 10.4%), 3위 독일(약 7.9%)과 격차도 크다.
중국은 그간 1945년 유네스코 출범 당시 가맹한 회원국이란 사실을 내세우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2014년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를 직접 방문했고,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유네스코의 여성 교육 캠페인 특별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등재 건수는 올해 1월 기준 56건으로 이탈리아(58)에 이어 2위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유엔 산하 기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중국도 미국의 복귀 계획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진 유네스코 주재 중국 대사는 “그동안 미국의 부재가 유네스코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의 복귀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미국이 재가입하기로 한 것은 유네스코의 사명과 목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과 공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유네스코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키워왔다. 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유네스코 복귀 후 오는 11월 예정된 선거에서 이사국에 선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탈했던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인 틀인 '파리협정'과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속속 복귀했다.
미국은 재가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납부를 유보한 분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밀린 분담금 규모는 6억 달러(약 7800억원)로 추산된다고 AP가 전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와 재가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도 유네스코가 소련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구실로 유네스코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탈퇴했다. 그러다가 18년만인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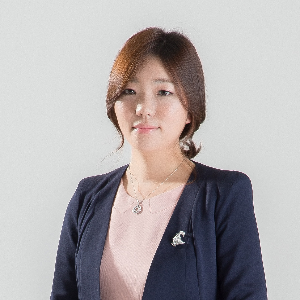



![[이슈추적]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툭하면 빠지는 이유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0/15/c711ed5f-58f4-40f7-8141-ecb1edea0e28.jpg.tn_250.jpg)


















